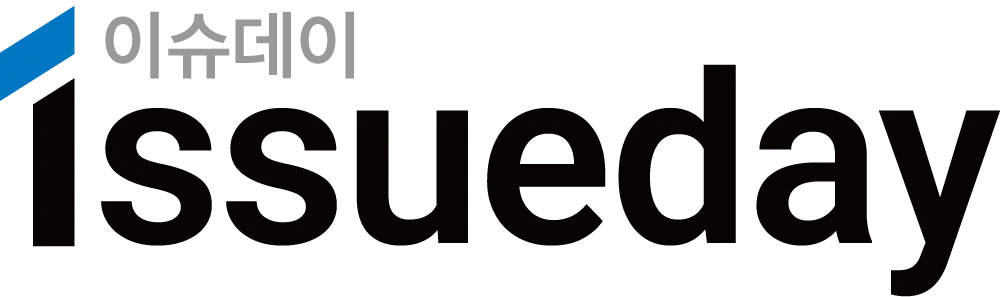여성 승모판 역류증 환자, 초기부터 사망 위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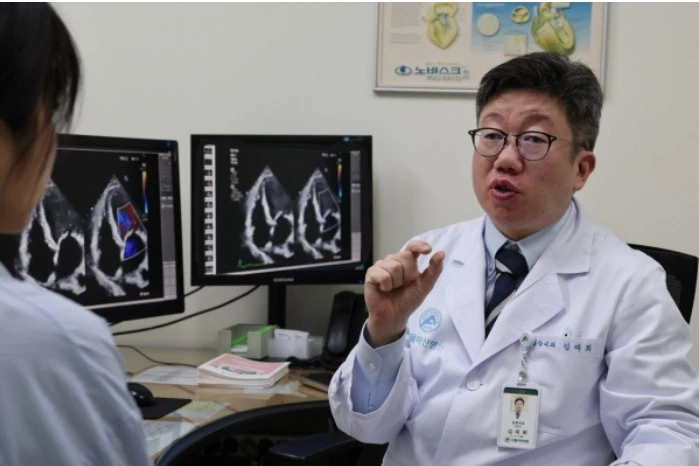
중증 퇴행성 승모판 역류증 환자 중 여성은 남성보다 질환 초기부터 사망 위험이 더 높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이는 동일한 수술 기준을 적용해온 기존 의료 체계에 성별을 고려한 맞춤형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퇴행성 승모판 역류증은 노화 등으로 승모판이 완전히 닫히지 않아 좌심실에서 좌심방으로 혈액이 역류하는 질환으로, 심부전과 사망 위험을 높이기 때문에 반드시 수술적 치료가 요구된다.
수술 방식은 판막 성형술 또는 인공 판막치환술이 주로 시행된다.
서울아산병원 심장내과 김대희 교수와 서울대병원 순환기내과 곽순구·이승표 교수 연구팀은 2006년부터 2020년까지 중증 퇴행성 승모판 역류증으로 수술받은 환자 1686명을 8.2년간 추적 관찰하고 좌심실 기능과 사망률 간의 성별 차이를 분석했다.
좌심실 기능 평가는 심초음파 기반 박출률(LVEF)과 정밀 영상지표인 좌심실 종축변형률(LV-GLS)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참여자들은 좌심실 박출률 기준으로 ▲55% 이하 ▲55~60% ▲60% 초과 세 그룹으로 나뉘었다.
그 결과, 여성은 좌심실 박출률이 55~60%인 단계부터 사망률이 높아지기 시작해 55% 이하와 유사한 사망 위험을 보였지만, 남성은 박출률이 55% 이하일 때만 유의미한 사망률 증가를 보였다. 좌심실 종축변형률 지표에서도 유사한 양상이 관찰됐다.
무증상 환자만을 분석한 결과에서도 여성은 좌심실 기능 저하 초기부터 사망 위험이 증가한 반면, 남성은 증상이 없을 경우 기능 저하가 사망률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연구진은 “좌심실 종축변형률은 증상이 없거나 좌심실 박출률이 정상으로 보이는 환자에서도 중증 승모판 역류증의 예후를 정밀하게 예측할 수 있는 지표로 좌심실 기능 저하의 초기 신호를 조기에 포착해 수술 시기를 더 정확히 판단할 수 있다”며 “향후 성별 차이를 반영한 맞춤형 수술 가이드라인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좌심실 종축변형률은 증상이 없거나 박출률이 정상인 환자에서도 예후를 정밀하게 예측할 수 있는 지표로 주목받고 있다.
이번 연구는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지원을 받아 수행됐으며, 국제학술지 JAMA Network Open에 최근 게재됐다.
배동현 (grace8366@sabanamedia.com) 기사제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