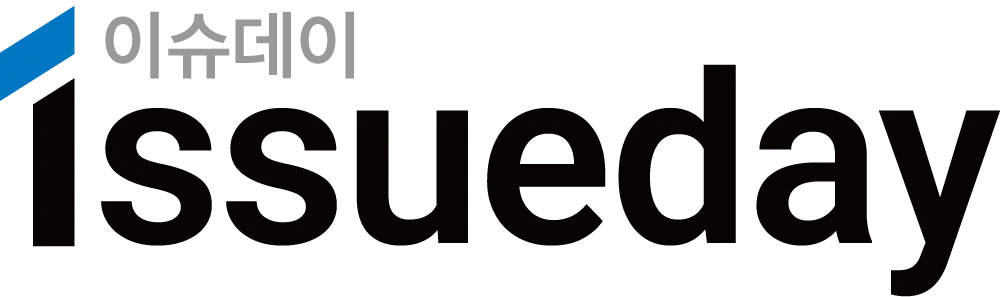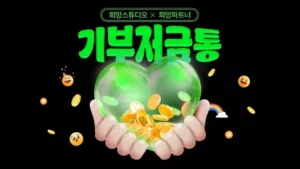1월 출생아 수 2만4천명…10년 만에 첫 증가, 11.6% ‘역대 최고 상승률’ 기록

올해 1월, 출생아 수가 2만4000명에 육박하며 10년 만에 전년 동기 대비 증가세로 돌아섰다.
이는 최근 수년간 이어졌던 초저출산 기조 속에서 의미 있는 반등으로 평가된다.
특히 증가율은 통계 작성 이래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며, 인구 구조 변화의 전환점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26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1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올해 1월 태어난 아기 수는 총 2만3947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달(2만1461명)보다 2486명 증가한 수치로, 증가율은 11.6%에 달한다.
1월 기준 출생아 수가 전년 동월 대비 늘어난 것은 2015년 이후 10년 만이며, 증가 폭은 2011년(4641명) 이후 최대치다.
통계청은 “1월 기준 증가율로는 1981년 통계 작성 이래 최고 기록”이라고 밝혔다.
출생아 수는 지난해 9월부터 5개월 연속으로 전년 같은 달보다 증가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이는 30대 인구가 많은 ‘2차 베이비붐(에코붐)’ 세대가 본격적인 출산 연령에 진입한 데다, 코로나19 팬데믹 시기 급감했던 결혼이 최근 다시 회복세를 보이면서 출산 수요로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지난해 연간 출생아 수도 8300명 늘며 9년 만에 증가세로 돌아선 바 있다.
출생아 수 증가에 따라 합계출산율도 소폭 상승했다. 1월 합계출산율은 0.88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의 0.80명보다 0.08명 증가했다.
통계청은 그간 분기 단위로 공표하던 합계출산율을 이번부터 월별로 산출해 발표하기 시작했으며, 향후에는 출산율 변화를 더 세밀하게 관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반면 사망자 수는 급증했다. 1월 사망자는 총 3만9473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3만2392명)보다 7081명(21.9%) 증가했다.
증가율은 통계 작성이 시작된 1981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통계청은 이 같은 사망자 수 급증 원인으로 인구 고령화 심화와 1월의 한파·폭설 등 기상 악화 상황을 꼽았다.
실제로 고령층을 중심으로 한 기저질환자들의 사망률이 큰 폭으로 상승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결과로 1월 한 달 동안 자연 인구는 1만5526명 감소했다. 출생아 수 증가에도 불구하고 사망자 수가 이를 웃돌면서 자연 감소 현상은 계속됐다.
한국은 2020년부터 본격적인 인구 자연 감소 국면에 접어든 이후 매년 수만 명 단위의 인구가 줄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같은 기간 혼인 건수는 2만153건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149건(0.7%) 증가한 수치로, 결혼이 서서히 회복세에 들어섰다는 점에서 출생아 수 증가와 연결될 가능성이 있다.
이혼 건수는 6922건으로, 지난해 같은 달(7939건)보다 1017건(12.8%) 감소했다.
통계청은 이혼 감소의 배경에 대해서는 명확한 분석을 내놓지 않았지만, 전체 혼인 감소 및 고령층 부부의 이혼률 변화 등이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출생아 수 증가세가 단기간의 반등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인 회복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정책적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한 인구사회학 전문가는 “2차 에코붐 세대의 출산 영향으로 일시적 증가가 있을 수 있지만, 출산율 반등으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주거, 육아, 고용 등 실질적인 삶의 여건이 개선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현재 다양한 저출산 대응책을 마련 중이며, 보육과 주거 지원, 남녀 육아휴직 확대 등의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최근 발표된 ‘인구감소지역 특별지원법’ 등은 지방 소멸을 막고 지역 내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기반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1월 통계는 출산과 사망, 혼인과 이혼 등 우리 사회 인구구조의 현재를 가장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지표다.
이번 통계는 그간 하락 일변도였던 출생 지표가 반등 조짐을 보였다는 점에서 긍정적이지만, 여전히 사망자 수와 자연 감소 문제는 심각한 상황이다.
출산율 증가의 흐름이 일시적인 ‘반짝 효과’로 끝나지 않고, 장기적인 인구 구조 개선의 신호탄이 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소율 (lsy@sabanamedia.com) 기사제보